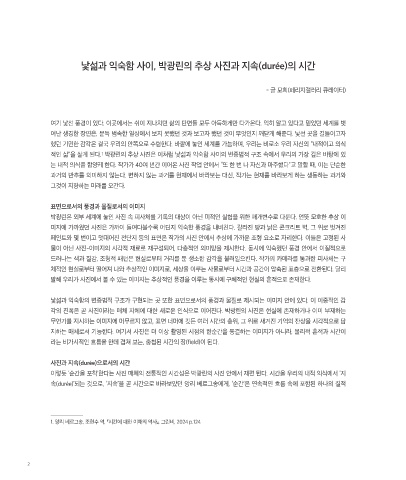Page 4 - 박광린 개인전 2025. 9. 26 – 10. 1 아트프라자갤러리
P. 4
낯섦과 익숙함 사이, 박광린의 추상 사진과 지속(durée)의 시간
- 글 모희(페리지갤러리 큐레이터)
여기 낯선 풍경이 있다. 이곳에서는 쉬이 지나치던 삶의 단면들 모두 아득하게만 다가온다. 익히 알고 있다고 믿었던 세계를 벗
어난 생경한 장면은, 문득 범속한 일상에서 보지 못했던 것과 보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다. 낯선 곳을 길들이고자
했던 기민한 감각은 결국 우리의 안쪽으로 수렴한다. 바깥에 놓인 세계를 가늠하며,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의 “내적이고 의식
적인 삶”을 살게 된다. 1 박광린의 추상 사진은 이처럼 낯섦과 익숙함 사이의 변증법적 구조 속에서 우리의 가장 깊은 바탕에 있
는 내적 의식을 함양케 한다. 작가가 40여 년간 이어온 사진 작업 안에서 “또 한 번 나 자신과 마주했다”고 말할 때, 이는 단순한
과거의 반추를 의미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과거를 현재에서 바라보는 대신, 작가는 현재를 바라보게 하는 생동하는 과거와
그것이 지향하는 미래를 오간다.
표면으로서의 풍경과 물질로서의 이미지
박광린은 외부 세계에 놓인 사진 속 피사체를 기록의 대상이 아닌 미적인 실험을 위한 매개변수로 다룬다. 언뜻 모호한 추상 이
미지에 가까웠던 사진은 가까이 들여다볼수록 어딘지 익숙한 풍경을 내비친다. 갈라진 땅과 낡은 콘크리트 벽, 그 위로 벗겨진
페인트와 몇 번이고 덧대어진 전단지 등의 표면은 작가의 사진 안에서 추상에 가까운 조형 요소로 자리한다. 이들은 고정된 사
물이 아닌 사진-이미지의 시각적 재료로 재구성되어, 다층적인 의미망을 제시한다. 동시에 익숙했던 풍경 안에서 이질적으로
드러나는 색과 질감, 조형적 패턴은 현실로부터 거리를 둔 생소한 감각을 불러일으킨다. 작가의 카메라를 통과한 피사체는 구
체적인 현실로부터 떨어져 나와 추상적인 이미지로, 세상을 이루는 사물로부터 시간과 공간이 압축된 표층으로 전환된다. 달리
말해 우리가 사진에서 볼 수 있는 이미지는 추상적인 풍경을 이루는 동시에 구체적인 현실의 흔적으로 존재한다.
낯섦과 익숙함의 변증법적 구조가 구현되는 곳 또한 표면으로서의 풍경과 물질로 제시되는 이미지 안에 있다. 이 이중적인 감
각의 진폭은 곧 사진이라는 매체 자체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이어진다. 박광린의 사진은 현실에 존재하거나 이미 부재하는
무언가를 지시하는 이미지에 머무르지 않고, 표면 너머에 깃든 여러 시간의 층위, 그 위로 새겨진 기억의 잔상을 시각적으로 담
지하는 매체로서 기능한다. 여기서 사진은 더 이상 촬영된 시점의 한순간을 동결하는 이미지가 아니라, 물리적 흔적과 시간이
라는 비가시적인 흐름을 한데 겹쳐 보는, 중첩된 시간의 장(field)이 된다.
사진과 지속(durée)으로서의 시간
이렇듯 ‘순간을 포착’한다는 사진 매체의 전통적인 시간성은 박광린의 사진 안에서 재편 된다. 시간을 우리의 내적 의식에서 ‘지
속(durée)’되는 것으로, ‘지속’을 곧 시간으로 바라보았던 앙리 베르그송에게, ‘순간’은 연속적인 흐름 속에 포함된 하나의 질적
1. 앙리 베르그송, 조현수 역, 『시간에 대한 이해의 역사』, 그린비, 2024 p.12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