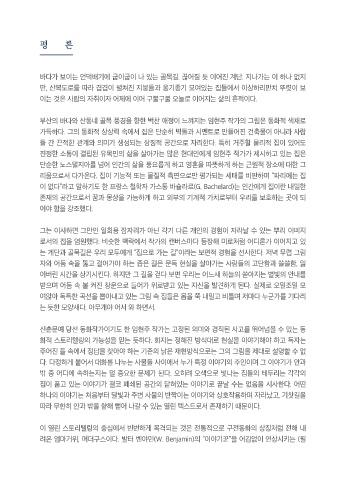Page 2 - 임현주 개인전 22. 4. 27 – 5. 3 가온갤러리
P. 2
평 론
바다가 보이는 언덕배기에 굽이굽이 나 있는 골목길. 끊어질 듯 이어진 계단. 지나가는 이 하나 없지
만, 산복도로를 따라 겹겹이 펼쳐진 지붕들과 옹기종기 모여있는 집들에서 이상하리만치 뚜렷이 보
이는 것은 사람의 자취이자 어제에 이어 구불구불 오늘로 이어지는 삶의 흔적이다.
부산의 바다와 산동네 골목 풍경을 향한 벅찬 애정이 느껴지는 임현주 작가의 그림은 동화적 색채로
가득하다. 그의 동화적 상상력 속에서 집은 단순히 벽돌과 시멘트로 만들어진 건축물이 아니라 사람
들 간 끈적한 관계와 의미가 생성되는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한다. 특히 거주할 물리적 집이 있어도
진정한 소통이 결핍된 유목민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에게 임현주 작가가 제시하고 있는 집은
단순한 노스탤지아를 넘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영혼을 따뜻하게 하는 근원적 장소에 대한 그
리움으로서 다가온다. 집이 기능적 또는 물질적 측면으로만 평가되는 세태를 비판하며 “파리에는 집
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한 프랑스 철학자 가스통 바슐라르(G. Bachelard)는 인간에게 집이란 내밀한
존재의 공간으로서 꿈과 몽상을 가능하게 하고 외부의 기계적 가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곳이 되
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이사하면 그만인 일회용 잠자리가 아닌 각기 다른 개인의 경험이 자라날 수 있는 뿌리 이미지
로서의 집을 염원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작가의 캔버스마다 등장해 미로처럼 어디론가 이어지고 있
는 계단과 골목길은 우리 모두에게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보편적 경험을 선사한다. 저녁 무렵 그림
자와 어둠 속을 뚫고 걸어가야 하는 좁은 길은 문득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단함과 쓸쓸함, 잃
어버린 시간을 상기시킨다. 하지만 그 길을 걷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하늘의 쏟아지는 별빛의 안내를
받으며 어둠 속 불 켜진 창문으로 들어가 위로받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실제로 오밀조밀 모
여앉아 독특한 곡선을 뽑아내고 있는 그림 속 집들은 몸을 쭉 내밀고 비틀며 저마다 누군가를 기다리
는 듯한 모양새다. 아무개야 어서 와 하면서.
신춘문예 당선 동화작가이기도 한 임현주 작가는 고정된 의미와 경직된 사고를 뛰어넘을 수 있는 동
화적 스토리텔링의 가능성을 믿는 듯하다. 화자는 정해진 방식대로 현실을 이야기해야 하고 독자는
주어진 틀 속에서 정답을 찾아야 하는 기존의 낡은 재현방식으로는 그의 그림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
다. 다정하게 붙어서 대화를 나누는 사물들 사이에서 누가 특정 이야기의 주인이며 그 이야기가 안과
밖 중 어디에 속하는지는 덜 중요한 문제가 된다. 오히려 오색으로 빛나는 집들의 테두리는 각각의
집이 품고 있는 이야기가 결코 폐쇄된 공간의 닫혀있는 이야기로 끝날 수는 없음을 시사한다. 어떤
하나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달빛과 주변 사물의 반짝이는 이야기와 상호작용하며 자라났고, 기찻길을
따라 무한히 안과 밖을 향해 뻗어 나갈 수 있는 열린 텍스트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열린 스토리텔링의 중심에서 빈번하게 목격되는 것은 전통적으로 구전동화의 상징처럼 전해 내
려온 엄마거위, 머더구스이다. 발터 벤야민(W. Benjamin)의 “이야기꾼”을 어김없이 연상시키는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