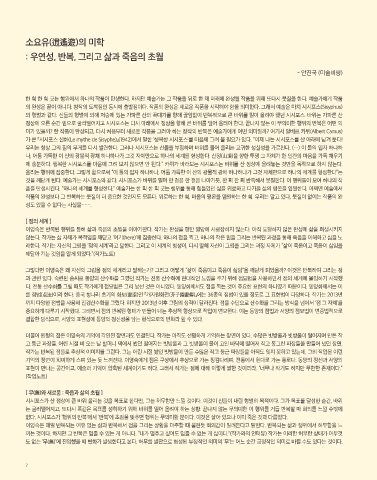Page 4 - 이영숙 개인전 2023. 9. 20 - 10. 1 아트뮤지엄 려
P. 4
소요유(逍遙遊)의 미학
: 우연성, 반복, 그리고 삶과 죽음의 초월
- 안진국 (미술비평)
한 획 한 획 긋는 행위에서 하나의 작품이 탄생한다. 하지만 예술가는 그 작품을 뒤로 한 채 미래에 완성될 작품을 위해 또다시 붓질을 한다. 예술가에게 작품
의 완성은 끝이 아니다. 창작의 도착점인 동시에 출발점이다. 작품의 완성은 새로운 작품을 시작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예술은 마치 시시포스(Sisyphus)
의 형벌과 같다. 신들의 형벌에 의해 저승에 있는 가파른 산의 꼭대기를 향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큰 바위를 밀어 올려야 했던 시시포스. 바위는 가파른 산
정상에 오른 순간 밑으로 굴러떨어지고 시시포스는 다시 아래에서 정상을 향해 큰 바위를 밀어 올려야 한다. 끝나지 않는 이 무의미한 행위의 반복은 어떤 의
미가 있을까? 한 작품이 완성되고, 다시 처음부터 새로운 작품을 그려야 하는 창작의 반복은 예술가에게 어떤 의미일까? 여기서 알베르 카뮈(Albert Camus)
가 쓴 『시시포스 신화(Le mythe de Sisyphe)』(1942)에서 말한 ‘행복한 시시포스’를 마음에 그려 볼 필요가 있다. “이제 나는 시시포스를 산 아래에 남겨 둔다!
우리는 항상 그의 짐의 무게를 다시 발견한다. 그러나 시시포스는 신들을 부정하며 바위를 들어 올리는 고귀한 성실성을 가르친다. (…) 이 돌의 입자 하나하
나, 어둠 가득한 이 산의 광물적 광채 하나하나가 그것 자체만으로 하나의 세계를 형성한다. 산정(山頂)을 향한 투쟁 그 자체가 한 인간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
에 충분하다. 행복한 시시포스를 마음에 그려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카뮈가 바라보는 시시포스는 바위를 산 정상에 올려놓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올리는 행위에 집중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돌의 입자 하나하나, 어둠 가득한 이 산의 광물적 광채 하나하나가 그것 자체만으로 하나의 세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예술가는 시시포스와 같다. 시시포스가 바위를 밀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듯, 한 획 한 획 반복해서 붓질한다. 이 행위들이 모여 하나의 작
품을 탄생시킨다. “하나의 세계를 형성한다.” 예술가는 한 획 한 획 긋는 행위를 통해 힘들었던 삶을 위로하고 다가올 삶의 평온을 염원한다. 어쩌면 예술에서
작품의 완성보다 그 반복하는 붓질이 더 중요한 것인지도 모른다. 위로하는 한 획, 마음의 평온을 염원하는 한 획. 우리는 알고 있다, 붓질이 없이는 작품의 완
성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 점의 세계 ]
이영숙은 반복된 행위를 통해 삶과 죽음의 초월을 이야기한다. 작가는 완성을 향한 열망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아직 도달하지 않은 완성에 삶을 희생시키지
않는다. 작가는 삶 자체가 목적임을 깨닫고 ‘여기(here)’에 집중한다. 하나의 점을 찍고, 하나의 작은 원을 그리는 반복된 과정을 통해 죽음을 이해하고 삶을 노
래한다. 작가는 자신의 그림을 ‘점의 세계’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 세계의 형성이, 다시 말해 자신이 그림을 그리는 과정 자체가 “삶이 죽음이고 죽음이 삶임을
깨달아 가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작가노트)
그렇다면 이영숙은 왜 자신의 그림을 점의 세계라고 말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삶이 죽음이고 죽음이 삶임”을 깨닫게 되었을까? 이것은 반복하여 그리는 점
과 관련 있다. 숙련된 솜씨로 동양의 산수화를 그렸던 작가는 전통 산수화에 현대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 점묘법을 사용하면서 점의 세계에 몰입하기 시작했
다. 전통 산수화를 그릴 때도 작가에게 점묘법은 그리 낯선 것은 아니었다. 동양화에서도 점을 찍는 것이 주요한 표현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동양화에서는 이
를 점법(点法)이라 한다. 중국 청나라 초기의 화보(畵譜)인 『개자원화전(芥子園畵傳)』에는 36종의 점법이 있을 정도로 그 표현법이 다양하다. 작가는 2013년
까지 다양한 점법을 사용해 진경산수화를 그렸다. 하지만 2013년 이후 그림의 성격이 달라진다. 점을 수단으로 산수화를 그리는 방식을 넘어서 ‘점 그 자체’를
중요하게 다루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점의 반복된 형태가 만들어 내는 추상적 형상으로 작업이 변모한다. 이는 동양의 점법과 서양의 점묘법이 변증법적으로
결합한 방식으로, 서양의 표현성에 동양의 정신성을 담는 형식으로의 변화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원형의 점은 이영숙의 기억에 각인된 장면과도 연결된다. 작가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는 장면이 있다. 수많은 빗방울과 빗방울이 떨어지며 만든 작
고 둥근 파장들. 어린 시절 비 오는 날 할머니 댁에서 봤던 떨어지는 빗방울과 그 빗방울이 물이 고인 바닥에 떨어져 작고 동그란 파장들을 만들어 냈던 장면.
작가는 반복된 점들로 추상적 이미지를 그린다. 그는 어린 시절 봤던 빗방울이 만든 수많은 작고 둥근 파장들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는데, 그의 작업은 이런
기억의 장면이 희미하게 스며 있는 듯 느껴진다. 이영숙에게 점은 구상에서 추상으로 가는 징검다리며, 전통에서 현대로 가는 통로다. 동양의 정신과 서양의
표현이 만나는 공간이고, 예술과 기억이 압축된 세계이기도 하다. 그래서 작가는 점에 대해 이렇게 말한 것이리라. “너무나 작기도 하지만 무한한 존재이다.”
(작업노트)
[ 무(無)와 새로움 : 죽음과 삶의 초월 ]
시시포스가 산 정상에 큰 바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그는 허무함만 느낄 것이다. 이것이 신들이 내린 형벌의 목적이다. 그가 목표를 달성한 순간, 바위
는 굴러떨어지고, 또다시 똑같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바위를 밀어 올려야 하는 상황. 끝나지 않는 무의미한 이 행위를 거듭 반복할 때 회의를 느낄 수밖에
없다. 시시포스가 ‘행위의 반복’에서 ‘반복’에 초점을 맞추면 행위는 무의미할 뿐이다. 이것은 살아 있으나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다.
이영숙은 매일 반복되는 여유 없는 삶과 반복해서 점을 그리는 상황을 마주할 때 불현듯 회의감이 밀려든다고 말한다. 반복되는 삶과 행위에서 허무함을 느
끼는 것이다. 하지만 그 반복은 멈출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는 게 삶이다.”(작가와의 인터뷰) 작가는 이러한 허무한 상태가 아무것
도 없는 ‘무(無)’에 진입했을 때 변화가 발생한다고 본다. 허무를 발판으로 형성된 부정적인 의미의 ‘무’는 어느 순간 긍정적인 의미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