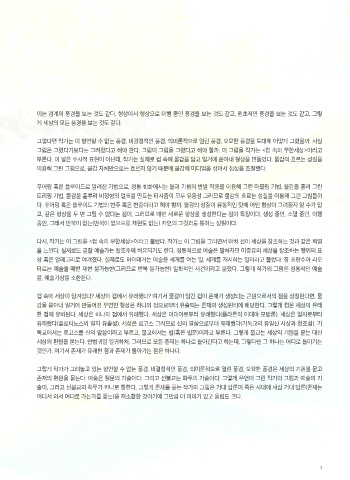Page 5 - 김연식 개인전 2023 5. 5. 30 갤러리모나리자 산촌
P. 5
이는 경계의 풍경을 보는 것도 같다. 형상에서 형상으로 이행 중인 풍경을 보는 것도 같고, 원초적인 풍경을 보는 것도 같고, 그렇
게 세상의 모든 풍경을 보는 것도 같다.
그렇다면 작가는 이 형언할 수 없는 풍경, 비결정적인 풍경, 의미론적으로 열린 풍경, 오묘한 풍경을 도대체 어떻게 그렸을까. 사실
그림은 그렸다기보다는 그려졌다고 해야 한다. 그림이 그림을 그렸다고 해야 할까. 이 그림을 작가는 <컵 속의 무한세상>이라고
부른다. 이 말은 수사적 표현이 아닌데, 작가는 실제로 컵 속에 물감을 담고 일거에 쏟아내 형상을 만들었다. 물감의 흐르는 성질을
이용해 그린 그림으로, 물감 자체만으로는 흐르지 않기 때문에 물감에 미디엄을 섞어서 점성을 조절했다.
푸어링 혹은 플루이드로 알려진 기법으로, 정통 회화에서는 물과 기름의 반발 작용을 이용해 그린 마블링 기법, 물감을 흘려 그린
드리핑 기법, 물감을 흩뿌려 비정형의 얼룩을 만드는 타시즘이 모두 유동성 그러므로 물감의 흐르는 성질을 이용해 그린 그림들이
다. 푸어링 혹은 플루이드 기법의 변주 혹은 변종이라고 해야 할까. 물감의 성질이 유동적인 탓에 어떤 형상이 그려질지 알 수가 없
고, 같은 형상을 두 번 그릴 수 없다는 점이, 그러므로 매번 새로운 형상을 생성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생성 중인, 소멸 중인, 이행
중인, 그래서 반복이 없는(반복이 없으므로 재현도 없는) 자연의 그것과도 통하는 성질이다.
다시, 작가는 이 그림을 <컵 속의 무한세상>이라고 불렀다. 작가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마치 신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과 같은 희열
을 느낀다. 실제로도 곧잘 예술가는 창조주에 비유되기도 한다. 정통적으로 예술은 말하자면 미증유의 세상을 창조하는 행위의 표
상 혹은 알레고리로 여겨졌다. 실제로도 하이데거는 예술을 세계를 여는 일, 세계를 개시하는 일이라고 불렀다. 장 프랑수아 리오
타르는 예술을 매번 재현 불가능한(그러므로 반복 불가능한) 일회적인 사건이라고 불렀다. 그렇게 작가의 그림은 정통적인 예술
을, 예술가상을 소환한다.
컵 속에 세상이 담겨있다? 세상이 컵에서 유래했다? 여기서 물감이 담긴 컵이 존재가 생성되는 근원으로서의 점을 상징한다면, 물
감을 쏟아내 일거에 만들어진 우연한 형상은 하나의 점으로부터 유출되는 존재의 생성원리에 해당한다. 그렇게 컵은 세상이 유래
한 점에 유비된다. 세상은 하나의 점에서 유래했다. 세상은 이데아로부터 유래했다(플라톤의 이데아 모방론). 세상은 일자로부터
유래했다(플로티노스의 일자 유출설). 세상은 로고스 그러므로 신의 말씀으로부터 유래했다(기독교의 유일신 사상과 창조설). 기
독교에서는 로고스를 신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불교에서는 법(혹은 법문)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불교는 세상의 기원을 묻는 대신
세상의 환원을 묻는다. 만법귀일 일귀하처, 그러므로 모든 존재는 하나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
것인가. 여기서 존재가 유래한 점과 존재가 돌아가는 점은 하나다.
그렇게 작가가 그려놓고 있는 형언할 수 없는 풍경, 비결정적인 풍경, 의미론적으로 열린 풍경, 오묘한 풍경은 세상의 기원을 묻고
존재의 환원을 묻는다. 예술은 질문의 기술이다. 그리고 선불교는 화두의 기술이다. 그렇게 우연이 그린 작가의 그림과 예술의 기
술이, 그리고 선불교의 화두가 하나로 통한다. 그렇게 존재를 묻는 작가의 그림은 거대 담론이 죽은 시대에 새삼 거대 담론(존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묻는)을 재소환한 것이기에 그만큼 더 의미가 있고 울림도 크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