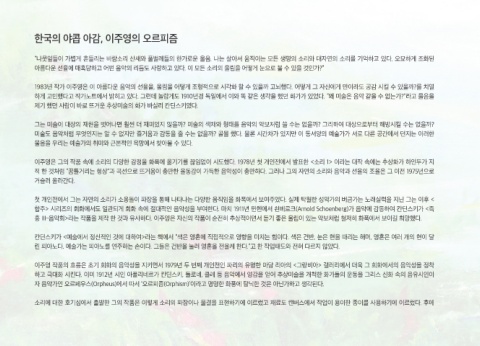Page 4 - 이주영 개인전 2022. 7. 6 - 7. 19 콩세유갤러리
P. 4
한국의 야콥 아감, 이주영의 오르피즘
“나뭇잎들이 가볍게 흔들리는 바람소리 산새와 풀벌레들의 한가로운 울음. 나는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생명의 소리와 대자연의 소리를 기억하고 있다. 오묘하게 조화된
아름다운 선율에 매혹당하고 어떤 음악의 리듬도 사랑하고 있다. 이 모든 소리의 울림을 어떻게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1983년 작가 이주영은 이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을, 울림을 어떻게 조형적으로 시각화 할 수 있을까 고뇌했다. 어떻게 그 자신에게 만이라도 공감 시킬 수 있을까?를 치열
하게 고민했다고 작가노트에서 밝히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1910년경 독일에서 이와 똑 같은 생각을 했던 화가가 있었다. “왜 미술은 음악 같을 수 없는가?”라고 물음을
제기 했던 사람이 바로 뜨거운 추상미술의 화가 바실리 칸딘스키였다.
그는 미술이 대상의 재현을 벗어나면 훨씬 더 재미있지 않을까? 미술의 색채와 형태를 음악의 악보처럼 쓸 수는 없을까? 그리하여 대상으로부터 해방시킬 수는 없을까?
미술도 음악처럼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즐거움과 감동을 줄 수는 없을까? 골몰 했다. 물론 시간차가 있지만 이 동서양의 예술가가 서로 다른 공간에서 던지는 이러한
물음을 우리는 예술가의 취미와 근본적인 욕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주영은 그의 작품 속에 소리의 다양한 감정을 화폭에 옮기기를 끊임없이 시도했다. 1978년 첫 개인전에서 발표한 <소리 1> 이라는 대작 속에는 추상화가 하인두가 지
적 한 것처럼 “꿈틀거리는 형상”과 곡선으로 뜨거움이 충만한 율동감이 가득한 음악성이 충만하다. 그러나 그의 자연의 소리와 음악과 선율의 조율은 그 이전 197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첫 개인전에서 그는 자연의 소리가 소용돌이 파장을 통해 나타나는 다양한 움직임을 화폭에서 보여주었다. 실제 탁월한 성악가의 버금가는 노래실력을 지닌 그는 이후 <
합주> 시리즈의 회화에서도 일관되게 회화 속에 절대적인 음악성을 부여한다. 마치 1911년 뮌헨에서 쇤베르크(Arnold Schoenberg)가 음악에 감동하여 칸딘스키가 <즉
흥 III-음악회>라는 작품을 제작 한 것과 유사하다. 이주영은 자신의 작품이 순전히 추상적이면서 듣기 좋은 울림이 있는 악보처럼 철저히 화폭에서 보이길 희망했다.
칸딘스키가 <예술에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라는 책에서 “색은 영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힘이다. 색은 건반, 눈은 현을 때리는 해머, 영혼은 여러 개의 현이 달
린 피아노다. 예술가는 피아노를 연주하는 손이다. 그들은 건반을 눌러 영혼을 전율케 한다.”고 한 작업태도와 전혀 다르지 않았다.
이주영 작품의 흐름은 초기 회화의 음악성을 지키면서 1979년 두 번째 개인전인 파리의 유명한 마담 리아의 <그랑비아> 갤러리에서 더욱 그 회화에서의 음악성을 정착
하고 극대화 시킨다. 이미 1912년 시인 아폴리네르가 칸딘스키, 들로네, 클레 등 음악에서 영감을 얻어 추상미술을 개척한 화가들의 운동을 그리스 신화 속의 음유시인이
자 음악가인 오르페우스(Orpheus)에서 따서 ‘오르피즘(Orphism)’이라고 명명한 화풍에 탐닉한 것은 아닌가하고 생각된다.
소리에 대한 호기심에서 출발한 그의 작품은 이렇게 소리의 파장이나 물결을 표현하기에 이르렀고 재료도 캔버스에서 작업이 용이한 종이를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