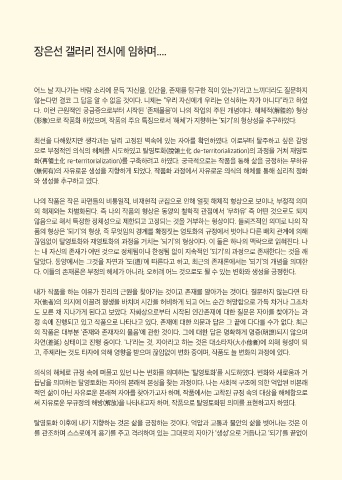Page 2 - 이자희 초대전 6. 11 – 6. 26 장은선갤러리
P. 2
장은선 갤러리 전시에 임하며....
어느 날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문득 ‘자신을, 인간을, 존재를 탐구한 적이 있는가’라고 느끼더라도 질문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 답을 알 수 없을 것이다. 니체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인식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였
다. 이런 근원적인 궁금증으로부터 시작된 ‘존재물음’이 나의 작업의 주된 개념이다. 해체적(解體的) 형상
(形象)으로 작품화 하였으며, 작품의 주요 특징으로서 ‘해체’가 지향하는 ‘되기’의 형상성을 추구하였다.
최선을 다해왔지만 생각과는 달리 고정된 벽속에 있는 자아를 확인하였다. 이로부터 탈주하고 싶은 갈망
으로 부정적인 의식의 해체를 시도하였고 탈영토화(脫領土化 de-territorialization)의 과정을 거쳐 재영토
화(再領土化 re-territorialization)를 구축하려고 하였다. 궁극적으로는 작품을 통해 삶을 긍정하는 무하유
(無何有)의 자유로운 생성을 지향하게 되었다. 작품화 과정에서 자유로운 의식의 해체를 통해 심리적 정화
와 생성을 추구하고 있다.
나의 작품은 작은 파편들의 비통일적, 비재현적 군집으로 인해 얼핏 해체적 형상으로 보이나, 부정적 의미
의 해체와는 차별화된다. 즉 나의 작품의 형상은 동양의 철학적 관점에서 ‘무하유’ 즉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음으로 해서 특정한 정체성으로 제한되고 고정되는 것을 거부하는 형상이다. 들뢰즈적인 의미로 나의 작
품의 형상은 ‘되기’의 형상, 즉 무엇임의 경계를 확정짓는 영토화의 규정에서 벗어나 다른 배치 관계에 의해
끊임없이 탈영토화와 재영토화의 과정을 거치는 ‘되기’의 형상이다. 이 둘은 하나의 맥락으로 읽혀진다. 나
는 내 자신의 존재가 어떤 것으로 정체됨이나 한정됨 없이 지속적인 ‘되기’의 과정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깨
달았다. 동양에서는 그것을 자연과 ‘도(道)’에 따른다고 하고, 최근의 존재론에서는 ‘되기’의 개념을 의미한
다. 이들의 존재론은 부정의 해체가 아니라, 오히려 어느 것으로도 될 수 있는 변화와 생성을 긍정한다.
내가 작품을 하는 이유가 진리의 근원을 찾아가는 것이고 존재를 알아가는 것이다. 질문하지 않는다면 타
자(他者)의 의지에 이끌려 평생을 바치며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어느 순간 허망함으로 가득 차거나 그조차
도 모른 채 지나가게 된다고 보았다. 자화상으로부터 시작된 인간존재에 대한 질문은 자아를 찾아가는 과
정 속에 진행되고 있고 작품으로 나타나고 있다. 존재에 대한 의문과 답은 그 끝에 다다를 수가 없다. 최근
의 작품은 대부분 ‘존재와 존재자의 물음’에 관한 것이다. 그에 대한 답은 명확하게 명증(明證)되지 않으며
차연(差延) 상태이고 진행 중이다. '나'라는 것, 자아라고 하는 것은 대소타자(大小他者)에 의해 형성이 되
고, 주체라는 것도 타자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끊임없이 변화 중이며, 작품도 늘 변화의 과정에 있다.
의식의 해체로 규정 속에 머물고 있던 나는 변화를 의미하는 ‘탈영토화’를 시도하였다. 변화와 새로움과 거
듭남을 의미하는 탈영토화는 자아의 본래적 본성을 찾는 과정이다. 나는 사회적 구조에 의한 억압된 비본래
적인 삶이 아닌 자유로운 본래적 자아를 찾아가고자 하며, 작품에서는 고착된 규정 속의 대상을 해체함으로
써 자유로운 무규정의 해방(解放)을 나타내고자 하며, 작품으로 탈영토화된 의미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탈영토화 이후에 내가 지향하는 것은 삶을 긍정하는 것이다. 억압과 고통과 불안의 삶을 벗어나는 것은 이
를 관조하며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며 있는 그대로의 자아가 ‘생성’으로 거듭나고 ‘되기’를 끝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