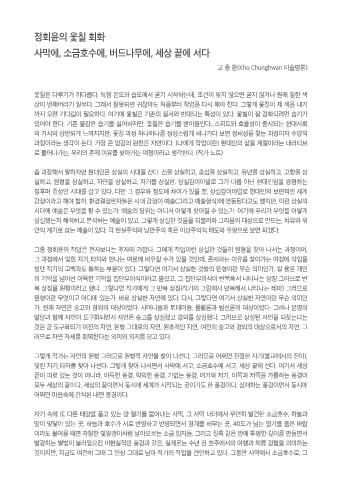Page 2 - 정회윤 초대전 3. 8 – 3. 25 장은선갤러리
P. 2
정회윤의 옻칠 회화
사막에, 소금호수에, 버드나무에, 세상 끝에 서다
고 충 환(Kho Chunghwan 미술평론)
옻칠은 다루기가 까다롭다. 특정 온도와 습도에서 굳기 시작하는데, 조건이 맞지 않으면 굳지 않거나 원래 칠한 색
상이 변해버리기 일쑤다. 그래서 잘못되면 귀찮아도 처음부터 작업을 다시 해야 한다. 그렇게 옻칠이 제 색을 내기
까지 오랜 기다림이 필요하다. 여기에 옻칠은 기존의 질서와 반대되는 특성이 있다. 옻칠이 잘 경화되려면 습기가
있어야 한다. 기존 물감은 습기를 싫어하지만, 옻칠은 습기를 받아들인다...스피드와 효율성이 중시되는 현대사회
의 가치와 상반되게 느껴지지만, 옻칠 과정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해나가다 보면 정체성을 찾는 과정이자 수양의
과정이라는 생각이 든다. 가장 큰 영감의 원천은 자연이다. (나에게 작업이란) 현대인의 삶을 계절이라는 내러티브
로 풀어나가는, 우리의 존재 이유를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한다. (작가 노트)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현대인은 상실의 시대를 산다. 신을 상실하고, 중심을 상실하고, 유년을 상실하고, 고향을 상
실하고, 원형을 상실하고, 자연을 상실하고, 자기를 상실한. 상실감이야말로 그가 다름 아닌 현대인임을 증명하는
징후며 증상인 시대를 살고 있다. 다만 그 경우와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상실감이야말로 현대인의 보편적인 세계
감정이라고 해야 할까. 환경결정론자들은 시대 감정이 예술(그리고 예술형식)에 연동된다고도 했지만, 이런 상실의
시대에 예술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예술의 당위는 어디서 어떻게 찾아질 수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상실했는지 해석하고 분석하는 예술이 있고, 그렇게 상실한 것들을 되불러와 그리움의 대상으로 만드는, 치유와 위
안의 계기로 삼는 예술이 있다. 각 현실주의와 낭만주의 혹은 이상주의적 태도와 유형으로 보면 되겠다.
그중 정회윤의 작업은 전자보다는 후자에 가깝다. 그에게 작업이란 상실한 것들의 원형을 찾아 나서는 과정이며,
그 과정에서 잊힌 자기_타자와 만나는 여로에 비유할 수가 있을 것인데, 존재하는 이유를 찾아가는 여정에 작업을
빗댄 작가의 고백과도 통하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상실한 것들의 원형이란 무슨 의미인가. 칼 융은 개인
의 기억을 넘어선 아득한 기억을 집단무의식이라고 불렀고, 그 집단무의식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상징 그러므로 반
복 상징을 원형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작가에게 그 반복 상징(작가의 그림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테마) 그러므로
원형이란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가. 바로 상실한 자연에 있다. 다시, 그렇다면 여기서 상실한 자연이란 무슨 의미인
가. 원래 자연은 숭고와 경외의 대상이었다. 샤머니즘과 토테미즘, 물활론과 범신론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문명의
발달과 함께 자연이 도구화되면서 자연은 숭고를 상실했고 경외를 상실했다. 그러므로 상실된 자연을 되찾는다는
것은 곧 도구화되기 이전의 자연, 원형 그대로의 자연, 원초적인 자연, 여전히 숭고와 경외의 대상으로서의 자연, 그
러므로 자연 자체를 회복한다는 의미와 의지를 담고 있다.
그렇게 작가는 자연의 원형 그러므로 원형적 자연을 찾아 나선다. 그러므로 어쩌면 진정한 자기(불교에서의 진아),
잊힌 자기_타자를 찾아 나선다. 그렇게 찾아 나서면서 사막에 서고, 소금호수에 서고, 세상 끝에 선다. 여기서 세상
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득한 풍경, 막막한 풍경, 가없는 풍경, 여기와 저기, 이쪽과 저쪽을 가름하는 풍경이
모두 세상의 끝이다. 세상의 끝이면서 동시에 세계가 시작되는 곳이기도 한 풍경이다. 실재하는 풍경이면서 동시에
어쩌면 마음속에 간직된 내면 풍경이다.
자기 속에 또 다른 태양을 품고 있는 양 열기를 뿜어내는 사막, 그 사막 너머에서 우연히 발견한 소금호수,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는 곳, 하늘과 호수가 서로 반영하고 반영되면서 경계를 허무는 곳, 40도가 넘는 열기를 품은 바람
이라도 불어올 때면 자잘한 빛알갱이처럼 날아오르는 소금 입자들, 그리고 칠흑 같은 밤에 투명한 깊이를 만들면서
발광하는 별빛이 불러일으킨 비현실적인 풍경과 같은, 실제로는 수년 전 호주에서의 여행과 체류 경험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때 그 인상 그대로 남아 작가의 작업을 견인하고 있다. 그동안 사막에서 소금호수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