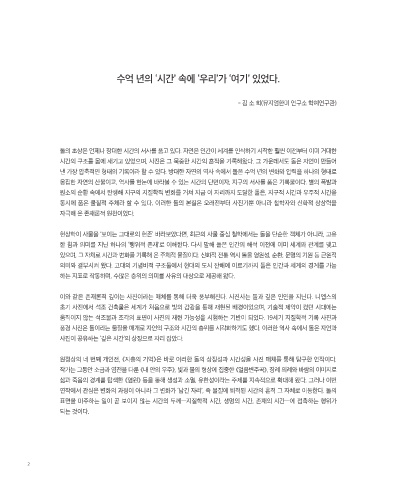Page 4 - 원정상 개인전 2025. 12. 3 – 12. 10 KT&G상상마당 춘천갤러리
P. 4
수억 년의 ‘시간’ 속에 ‘우리’가 ‘여기’ 있었다.
- 김 소 희(뮤지엄한미 연구소 학예연구관)
돌의 초상은 언제나 장대한 시간의 서사를 품고 있다. 자연은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기 시작한 훨씬 이전부터 이미 거대한
시간의 구조를 몸에 새기고 있었으며, 사진은 그 묵중한 시간의 흔적을 기록해왔다. 그 가운데서도 돌은 자연이 만들어
낸 가장 압축적인 형태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 방대한 자연의 역사 속에서 돌은 수억 년의 변화와 압력을 하나의 형태로
응집한 자연의 산물이고, 역사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의 단면이자, 지구의 서사를 품은 기록물이다. 별의 폭발과
원소의 순환 속에서 탄생해 지구의 지질학적 변화를 거쳐 지금 이 자리까지 도달한 돌은, 지구적 시간과 우주적 시간을
동시에 품은 물질적 주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돌의 본질은 오래전부터 사진가뿐 아니라 철학자와 신화적 상상력을
자극해 온 존재론적 원천이었다.
현상학이 사물을 ‘보이는 그대로의 현존’ 바라보았다면, 최근의 사물 중심 철학에서는 돌을 단순한 객체가 아니라, 고유
한 힘과 의미를 지닌 하나의 ‘행위적 존재’로 이해한다. 다시 말해 돌은 인간의 해석 이전에 이미 세계와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 자체로 시간과 변화를 기록해 온 주체적 물질이다. 신화적 전통 역시 돌을 영원성, 순환, 문명의 기원 등 근원적
의미와 결부시켜 왔다. 고대의 기념비적 구조물에서 현대의 도시 잔해에 이르기까지 돌은 인간과 세계의 경계를 가늠
하는 지표로 작동하며, 수많은 층위의 의미를 사유의 대상으로 제공해 왔다.
이와 같은 존재론적 깊이는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 더욱 풍부해진다. 사진사는 돌과 깊은 인연을 지닌다. 니엡스의
초기 사진에서 석조 건축물은 세계가 처음으로 빛의 감광을 통해 재현된 배경이었으며, 기술적 제약이 컸던 시대에는
움직이지 않는 석조물과 조각의 표면이 사진의 재현 가능성을 시험하는 기반이 되었다. 19세기 지질학적 기록 사진과
풍경 사진은 돌이라는 물질을 매개로 자연의 구조와 시간의 층위를 시각화하기도 했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돌은 자연과
사진이 공유하는 ‘깊은 시간’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원정상의 네 번째 개인전, 《지층의 기억》은 바로 이러한 돌의 상징성과 시간성을 사진 매체를 통해 탐구한 연작이다.
작가는 그동안 소금과 염전을 다룬 《내 안의 우주》, 빛과 물의 형상에 집중한 《얼음변주곡》, 장례 의례와 바람의 이미지로
삶과 죽음의 경계를 탐색한 《염원》 등을 통해 생성과 소멸, 유한성이라는 주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그러나 이번
연작에서 관심은 변화의 과정이 아니라 그 변화가 ‘남긴 자리’, 즉 물질에 퇴적된 시간의 흔적 그 자체로 이동한다. 돌의
표면을 마주하는 일이 곧 보이지 않는 시간의 두께—지질학적 시간, 생명의 시간, 존재의 시간—에 접촉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