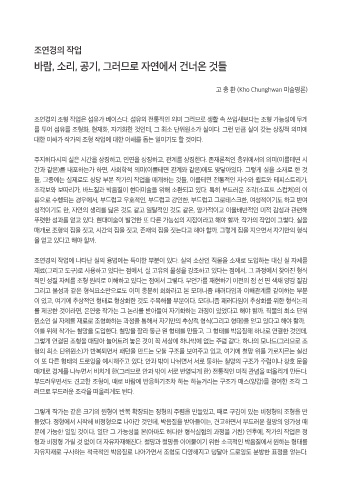Page 2 - 조연경 초대전 4. 26 – 5. 13 장은선갤러리
P. 2
조연경의 작업
바람, 소리, 공기, 그러므로 자연에서 건너온 것들
고 충 환 (Kho Chunghwan 미술평론)
조연경의 조형 작업은 섬유가 베이스다. 섬유의 전통적인 의미 그러므로 생활 속 쓰임새보다는 조형 가능성에 무게
를 두어 섬유를 조형화, 현재화, 자기화한 것인데, 그 최소 단위원소가 실이다. 그런 만큼 실이 갖는 상징적 의미에
대한 이해가 작가의 조형 작업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일이기도 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실은 시간을 상징하고, 인연을 상징하고, 관계를 상징한다. 존재론적인 층위에서의 의미(이를테면 시
간과 같은)를 내포하는가 하면, 사회학적 의미(이를테면 관계와 같은)에도 맞닿아있다. 그렇게 실을 소재로 한 것
들, 그중에는 실제로도 상당 부분 작가의 작업을 매개하는 것들, 이를테면 전통적인 자수와 퀼트와 테피스트리가,
조각보와 보따리가, 바느질과 박음질이 현대미술을 위해 소환되고 있다. 특히 부드러운 조각(소프트 스컵처)의 이
름으로 수행되는 경우에서, 부드럽고 우호적인, 부드럽고 강인한, 부드럽고 그로테스크한, 여성적이기도 하고 반여
성적이기도 한, 자연의 생리를 닮은 것도 같고 일탈적인 것도 같은, 양가적이고 이율배반적인 미적 감성과 관련해
뚜렷한 성과를 얻고 있다. 현대미술이 발견한 또 다른 가능성의 지점이라고 해야 할까. 작가의 작업이 그렇다. 실을
매개로 조형의 집을 짓고, 시간의 집을 짓고, 존재의 집을 짓는다고 해야 할까. 그렇게 집을 지으면서 자기만의 형식
을 얻고 있다고 해야 할까.
조연경의 작업에 나타난 실의 용법에는 특이한 부분이 있다. 실의 소산인 직물을 소재로 도입하는 대신 실 자체를
재료(그리고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 고유의 물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과정에서 찾아진 형식
적인 성질 자체를 조형 원리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무언가를 재현하기 이전의 점 선 면 색채 양감 질감
그리고 물성과 같은 형식요소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회화라고 본 모더니즘 패러다임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부분
이 있고, 여기에 추상적인 형태로 형상화한 것도 주목해볼 부분이다. 모더니즘 패러다임이 추상화를 위한 형식논리
를 제공한 것이라면, 은연중 작가는 그 논리를 받아들여 자기화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해야 할까. 직물의 최소 단위
원소인 실 자체를 재료로 조형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만의 추상적 형식(그리고 형태)을 얻고 있다고 해야 할까.
이를 위해 작가는 철망을 도입한다. 철망을 잘라 둥근 원 형태를 만들고, 그 형태를 박음질해 하나로 연결한 것인데,
그렇게 연결된 조형을 매달아 늘어트려 놓은 것이 꼭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주렴 같다. 하나의 모나드(그러므로 조
형의 최소 단위원소)가 반복되면서 패턴을 만드는 모듈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철망 위를 가로지르는 실선
이 또 다른 형태의 드로잉을 예시해주고 있다. 안과 밖이 나뉘면서 서로 통하는 철망의 구조가 주렴이나 창호 문을
매개로 경계를 나누면서 비치게 한(그러므로 안과 밖이 서로 반영되게 한) 전통적인 미적 관념을 떠올리게 만든다.
부드러우면서도 견고한 조형이, 때로 바람에 반응하기조차 하는 하늘거리는 구조가 매스(양감)를 결여한 조각 그
러므로 부드러운 조각을 떠올리게도 된다.
그렇게 작가는 같은 크기의 원형이 반복 확장되는 정형의 주렴을 만들었고, 때로 구김이 있는 비정형의 조형을 만
들었다. 정형에서 시작해 비정형으로 나아간 것인데, 박음질을 받아들이는, 견고하면서 부드러운 철망의 양가성 때
문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일단 그 가능성을 본(아마도 허다한 형식실험의 과정을 거친) 연후에, 작가의 작업은 정
형과 비정형 가릴 것 없이 더 자유자재해진다. 철망과 철망을 이어붙이기 위한 소극적인 박음질에서 원하는 형태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적극적인 박음질로 나아가면서 조형도 다양해지고 덩달아 드로잉도 분방한 표정을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