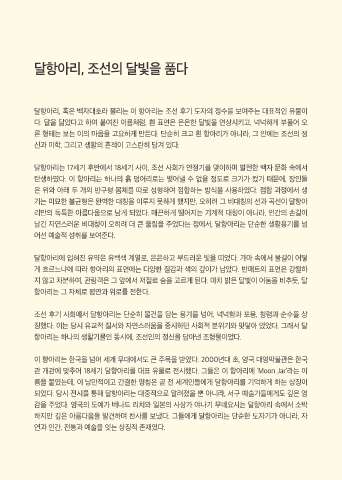Page 2 - 김종영 초대전 2025. 10. 15 – 10. 30 장은선갤러리
P. 2
달항아리, 조선의 달빛을 품다
달항아리, 혹은 백자대호라 불리는 이 항아리는 조선 후기 도자의 정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이
다. 달을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처럼, 흰 표면은 은은한 달빛을 연상시키고, 넉넉하게 부풀어 오
른 형태는 보는 이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든다. 단순히 크고 흰 항아리가 아니라, 그 안에는 조선의 정
신과 미학, 그리고 생활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달항아리는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사이, 조선 사회가 안정기를 맞이하며 발전한 백자 문화 속에서
탄생하였다. 이 항아리는 하나의 흙 덩어리로는 빚어낼 수 없을 정도로 크기가 컸기 때문에, 장인들
은 위와 아래 두 개의 반구형 몸체를 따로 성형하여 접합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접합 과정에서 생
기는 미묘한 불균형은 완벽한 대칭을 이루지 못하게 했지만, 오히려 그 비대칭의 선과 곡선이 달항아
리만의 독특한 아름다움으로 남게 되었다. 매끈하게 떨어지는 기계적 대칭이 아니라, 인간의 손길이
남긴 자연스러운 비대칭이 오히려 더 큰 울림을 주었다는 점에서, 달항아리는 단순한 생활용기를 넘
어선 예술적 성취를 보여준다.
달항아리에 입혀진 유약은 유백색 계열로, 은은하고 부드러운 빛을 띠었다. 가마 속에서 불길이 어떻
게 흐르느냐에 따라 항아리의 표면에는 다양한 질감과 색의 깊이가 남았다. 반매트의 표면은 강렬하
지 않고 차분하여, 관람객은 그 앞에서 저절로 숨을 고르게 된다. 마치 밝은 달빛이 어둠을 비추듯, 달
항아리는 그 자체로 평안과 위로를 전한다.
조선 후기 사회에서 달항아리는 단순히 물건을 담는 용기를 넘어, 넉넉함과 포용, 청렴과 순수를 상
징했다. 이는 당시 유교적 질서와 자연스러움을 중시하던 사회적 분위기와 맞닿아 있었다. 그래서 달
항아리는 하나의 생활기물인 동시에, 조선인의 정신을 담아낸 조형물이었다.
이 항아리는 한국을 넘어 세계 무대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다. 2000년대 초, 영국 대영박물관은 한국
관 개관에 맞추어 18세기 달항아리를 대표 유물로 전시했다. 그들은 이 항아리에 ‘Moon Jar’라는 이
름을 붙였는데, 이 낭만적이고 간결한 명칭은 곧 전 세계인들에게 달항아리를 기억하게 하는 상징이
되었다. 당시 전시를 통해 달항아리는 대중적으로 알려졌을 뿐 아니라, 서구 예술가들에게도 깊은 영
감을 주었다. 영국의 도예가 버나드 리치와 일본의 사상가 야나기 무네요시는 달항아리 속에서 소박
하지만 깊은 아름다움을 발견하며 찬사를 보냈다. 그들에게 달항아리는 단순한 도자기가 아니라, 자
연과 인간, 전통과 예술을 잇는 상징적 존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