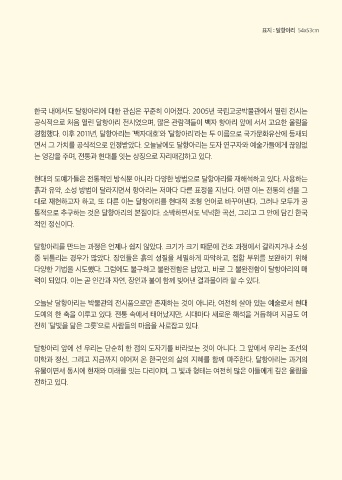Page 3 - 김종영 초대전 2025. 10. 15 – 10. 30 장은선갤러리
P. 3
표지 : 달항아리 54x53cm
한국 내에서도 달항아리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이어졌다. 2005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전시는
공식적으로 처음 열린 달항아리 전시였으며, 많은 관람객들이 백자 항아리 앞에 서서 고요한 울림을
경험했다. 이후 2011년, 달항아리는 ‘백자대호’와 ‘달항아리’라는 두 이름으로 국가문화유산에 등재되
면서 그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오늘날에도 달항아리는 도자 연구자와 예술가들에게 끊임없
는 영감을 주며, 전통과 현대를 잇는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대의 도예가들은 전통적인 방식뿐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달항아리를 재해석하고 있다. 사용하는
흙과 유약, 소성 방법이 달라지면서 항아리는 저마다 다른 표정을 지닌다. 어떤 이는 전통의 선을 그
대로 재현하고자 하고, 또 다른 이는 달항아리를 현대적 조형 언어로 바꾸어낸다. 그러나 모두가 공
통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달항아리의 본질이다. 소박하면서도 넉넉한 곡선,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한국
적인 정신이다.
달항아리를 만드는 과정은 언제나 쉽지 않았다. 크기가 크기 때문에 건조 과정에서 갈라지거나 소성
중 뒤틀리는 경우가 많았다. 장인들은 흙의 성질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접합 부위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기법을 시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함은 남았고, 바로 그 불완전함이 달항아리의 매
력이 되었다. 이는 곧 인간과 자연, 장인과 불이 함께 빚어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달항아리는 박물관의 전시품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 있는 예술로서 현대
도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전통 속에서 태어났지만, 시대마다 새로운 해석을 거듭하며 지금도 여
전히 ‘달빛을 닮은 그릇’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달항아리 앞에 선 우리는 단순히 한 점의 도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조선의
미학과 정신,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한국인의 삶의 지혜를 함께 마주한다. 달항아리는 과거의
유물이면서 동시에 현재와 미래를 잇는 다리이며, 그 빛과 형태는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