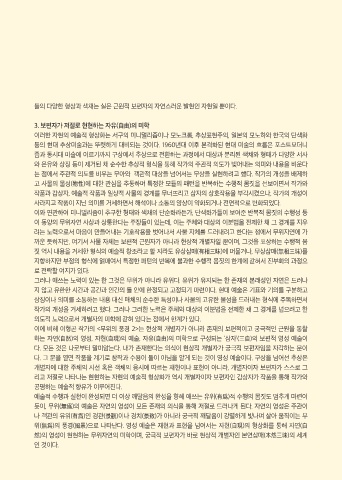Page 4 - 이형곤 초대전 9. 6 – 9. 22 장은선갤러리
P. 4
들의 다양한 형상과 색채는 실은 근원적 보편자의 자연스러운 발현인 자현일 뿐이다.
3. 보편자가 저절로 현현하는 자유(自由)의 미학
이러한 자현의 예술적 형상화는 서구의 미니멀리즘이나 모노크롬, 추상표현주의, 일본의 모노하와 한국의 단색화
등의 현대 추상미술과는 뚜렷하게 대비되는 것이다. 1960년대 이후 본격화된 현대 미술의 흐름은 포스트모더니
즘과 동시대 미술에 이르기까지 구상에서 추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대상과 분리된 색채와 형태가 다양한 서사
와 은유와 상징 등이 제거된 채 순수한 추상적 형식을 통해 작가의 주관적 의도가 빚어내는 의미와 내용을 비운다
는 점에서 주관적 의도를 비우는 무아와 객관적 대상을 넘어서는 무상을 실현하려고 했다. 작가의 개성을 배제하
고 사물의 물성(物性)에 대한 관심을 추동하며 특정한 모듈의 패턴을 반복하는 수행적 몸짓을 선보이면서 작가와
작품과 감상자, 예술적 작품과 일상적 사물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삼자의 상호작용을 부각시켰으나, 작가의 개성이
사라지고 작품이 지닌 의미를 거세하면서 해석이나 소통의 양상이 약화되거나 전면적으로 변화되었다.
이와 연관하여 미니멀리즘이 추구한 형태와 색채의 단순화라든가, 단색화가들이 보여준 반복적 몸짓의 수행성 등
이 동양의 무위자연 사상과 상통한다는 주장들이 있는데, 이는 주체와 대상의 이분법을 전제한 채 그 경계를 지우
려는 노력으로서 마음이 만들어내는 기호작용을 벗어나서 사물 자체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점에서 무위자연에 가
까운 듯하지만, 여기서 사물 자체는 보편적 근원자가 아니라 현상적 개별자일 뿐이며, 그것을 표상하는 수행적 몸
짓 역시 내용을 거세한 형식의 예술적 창조라고 할 지라도 유상삼매(有相三昧)에 머물거나, 무상삼매(無相三昧)를
지향하지만 부정의 형식에 얽매여서 특정한 패턴의 반복에 불과한 수행적 몸짓의 한계에 갇혀서 진부화의 과정으
로 전락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애쓰는 노력이 있는 한 그것은 무위가 아니라 유위다. 유위가 유지되는 한 존재의 본래성인 자연은 드러나
지 않고 유한한 시간과 공간과 인간의 틀 안에 한정되고 고정되기 마련이다. 현대 예술은 기표와 기의를 구분하고
상징이나 의미를 소통하는 내용 대신 매체의 순수한 특성이나 사물의 고유한 물성을 드러내는 형식에 주목하면서
작가의 개성을 거세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은 주체와 대상의 이분법을 전제한 채 그 경계를 넘으려고 한
의도적 노력으로서 개별자의 미학에 갇혀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이형곤 작가의 <무위의 풍경 2>는 현상적 개별자가 아니라 존재의 보편적이고 궁극적인 근원을 통찰
하는 자연(自然)의 영성, 자현(自現)의 예술, 자유(自由)의 미학으로 구성되는 ‘삼자’(三自)의 보편적 영성 예술이
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말미암는다. 내가 존재한다는 의식이 현상적 개별자가 궁극적 보편자임을 자각하는 문이
다. 그 문을 열면 작품을 계기로 창작과 수용이 둘이 아님을 알게 되는 것이 영성 예술이다. 구상을 넘어선 추상은
개별자에 대한 주체의 시선 혹은 객체의 응시에 따르는 재현이나 표현이 아니라, 개별자이자 보편자가 스스로 그
리고 저절로 나타나는 현현하는 자현의 예술적 형상화가 역시 개별자이자 보편자인 감상자가 작품을 통해 작가와
공명하는 예술적 향유가 이루어진다.
예술적 수행과 실천이 완성되면 더 이상 깨달음의 완성을 향해 애쓰는 유위(有爲)적 수행의 몸짓도 멈추게 마련이
듯이, 무위(無爲)의 예술은 자연의 영성이 모든 존재의 의식을 통해 저절로 드러나게 된다. 자연의 영성은 주관이
나 객관의 유위(有爲)인 경관(景觀)이나 경치(景致)가 아니라 궁극적 깨달음이 강렬하게 빛나며 살아 움직이는 무
위(無爲)의 풍경(風景)으로 나타난다. 영성 예술은 재현과 표현을 넘어서는 자현(自現)의 형상화를 통해 자연(自
然)의 영성이 현현하는 무위자연의 미학이며, 궁극적 보편자가 바로 현상적 개별자인 본연삼매(本然三昧)의 세계
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