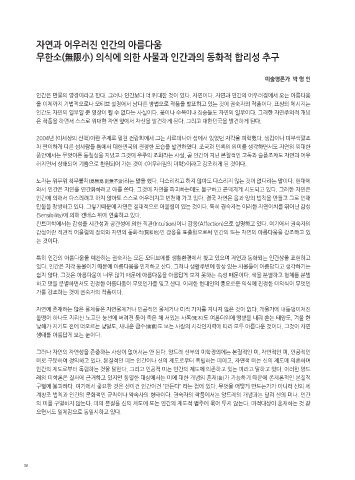Page 50 - 권숙자 개인전 2025. 10. 1 – 11. 15 권숙자안젤리미술관
P. 50
자연과 어우러진 인간의 아름다움
무한소(無限小) 의식에 의한 사물과 인간과의 동화적 합리성 추구
미술평론가 박 명 인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한다. 그러나 인간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다. 자연이다. 자연과 인간의 어우러짐에서 오는 아름다움
을 이제까지 기법적으로나 모티브 설정에서 남다른 방법으로 작품을 발표하고 있는 것이 권숙자의 작품이다. 표상의 메시지는
인간도 자연의 일부일 뿐 영장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꽃이나 수목이나 짐승들도 자연의 일부이다. 그러한 자연주의적 개념
은 작품을 하면서 스스로 위대한 자연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발견하게 된다.
2004년 (이세상의 산책)이란 주제로 펼친 전람회에서 그는 사르데니아 섬에서 있었던 자각을 피력했다. 생김이나 피부색깔조
차 판이하게 다른 섬사람들 틈에서 대한민국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였다. 조국과 민족의 의미를 생각하면서도 자연의 위대한
품안에서는 무엇이든 동질성을 지녔고 그것이 우주의 조화라는 사실, 곧 인간이 지닌 본질적인 고독과 슬픔조차도 자연과 어우
러지면서 상쇄되어 기쁨으로 환원되어 가는 것이 <어우러짐의 미학>이라고 강조하게 된 것이다.
노자는 위무위 칙무불치(爲無爲 則無不治)라는 말을 했다. 다스리려고 하지 않아도 다스리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말이다. 현대에
와서 인간은 자연을 인간화하려고 애를 쓴다. 그것이 자연을 파괴하는데도 불구하고 끈덕지게 시도되고 있다. 그러한 자연은
인간에 의해서 다스리려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어우러지고 변천해 가고 있다. 결국 자연은 음과 양의 법칙을 만들고 그로 인해
만물을 창생하고 있다. 그렇기때문에 자연은 절대적으로 어울림이 있는 것이다. 특히 권숙자는 이러한 자연이치를 뛰어난 감성
(Sensibility)에 의해 캔버스 위에 연출하고 있다.
칸트미학에서는 감성을 시간성과 공간성에 의한 직관(Intuition)이나 감응(Affection)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권숙자의
감성이란 직관적 어울림의 정의와 자연의 동화적(同和的)인 감응을 표출함으로써 인간의 또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
는 것이다.
특히 인간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권숙자는 모든 모티브에를 생활환경에서 찾고 있으며 자연과 동화되는 인간상을 표현하고
있다. 인간은 지각 동물이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인지하고 산다. 그러나 생활주변에 항상 있는 사물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 그것은 아름다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아름답게 보지 못하는 속성 때문이다. 색을 분별하고 형체를 분별
하고 맛을 분별하면서도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잊고 산다. 이러한 현대인의 풍요로운 의식에 진정한 미의식이 무엇인
가를 강조하는 것이 권숙자의 작품이다.
자연에 존재하는 많은 물체들은 자연물체거나 인공적인 물체거나 미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이 없다. 개울가에 내동댕이쳐진
돌멩이 하나도 지리산 노고단 능선에 버려진 듯이 죽은 채 서있는 사목(死木)도 여름더위에 땡볕을 내리 쏟는 태양도, 겨울 한
낮해가 지기도 전에 떠오르는 낮달도, 사나운 금수(禽獸)도 보는 사람의 시각인지력에 따라 모두 아름다운 것이다. 그것이 자연
생태를 아름답게 보는 눈이다.
그러나 자연의 자연성을 존중하는 사상이 없어서는 안 된다. 앙드레 신부의 미학정의에는 본질적인 미, 자연적인 미, 인공적인
미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본질적인 미는 인간이나 신의 제도로부터 독립하는 미이고, 자연적 미는 신의 제도에 의존하며
인간의 제도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인공적 미는 인간의 제도에 의존하고 있는 미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앙드
레의 미학론은 질서에 근거하고 있지만 동일한 대상에서는 미에 대한 개념의 혼재(在)가 가능하기 때문에 존재론적인 본질적
구별에 불과하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신이건 인간이건 “만든다” 라는 점에 있다. 무엇을 어떻게 만드는가가 아니라 신의 세
계창조 법칙과 인간의 문화적인 규칙이나 약속사의 형태이다. 권숙자의 작품에서는 앙드레의 개념과는 달리 신의 미나. 인간
의 미를 구별하지 않는다. 미의 본질을 신의 제도에 또는 인간의 제도적 범주에 묶어 두지 않는다. 미적대상이 혼재하는 것 같
으면서도 일체감으로 동일시하고 있다.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