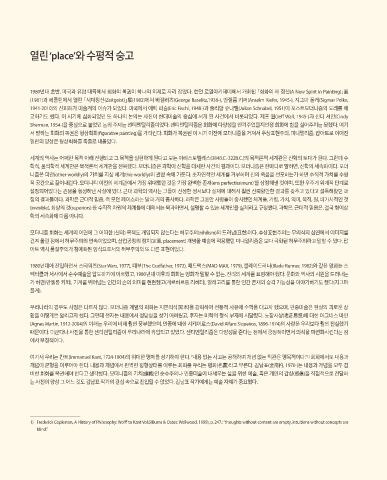Page 6 - 김남표 개인전 2023. 5. 10 – 5. 30 나마갤러리
P. 6
열린 ‘place’와 수평적 숭고
1980년대 초반, 미국과 유럽 대륙에서 회화의 복권이 하나의 의제로 자리 잡았다. 런던 로열아카데미에서 개최된 「회화의 새 정신(A New Spirit in Painting)」展
(1981)과 베를린에서 열린 「시대정신(Zeitgeist)」展(1982)에서 바젤리츠(George Baselitz,1938-), 안젤름 키퍼(Anselm Kiefer, 1945-), 지그마 폴케(Sigmar Polke,
1941-2010)의 신회화가 미술계의 이슈가 되었다. 미국에서 에릭 피슬(Eric Fischl, 1948-)과 줄리앙 슈나벨(Julian Schnabel, 1951)이 포스트모더니즘의 도래를 예
고하기도 했다. 이 시기에 심화되었던 또 하나의 논의는 사진이 현대미술의 중심에 서게 된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제프 월(Jeff Wall, 1945-)과 신디 셔먼(Cindy
Sherman, 1954-)을 중심으로 불었던 논의 주제는 센티멘털리즘이었다. 센티멘털리즘은 회화에 다양성을 안겨주었을지언정 회화에 힘을 실어주지는 못했다. 여기
서 말하는 회화의 복권은 형상회화(figurative painting)를 가리킨다. 회화가 복권된 이 시기 이전에 모더니즘을 거쳐서 추상표현주의, 미니멀리즘, 팝아트로 이어진
일련의 양상은 형상회화를 축출로 내몰았다.
세계의 역사는 어떠한 목적 아래 진행되고 그 목적을 실현하게 된다고 보는 아리스토텔레스(384B.C.-322B.C.)의 목적론적 세계관은 신학의 토대가 된다. 그런데 수
학적, 물리학적 세계관은 목적론적 세계관을 전복했다. 모더니즘은 과학이 신학을 대체한 사건의 결과이다. 모더니즘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학의 세속화이다. 모더
니즘은 피안(other-worldly)의 가치를 지상 세계(this-worldly)의 관점 속에 가둔다. 초자연적인 세계를 거부하며 신의 죽음을 선포하는가 하면 수직적 가치를 수평
적 공간으로 끌어내린다. 모더니티 이전의 세계관에서 가장 위대했던 것은 ‘가장 완벽한 존재(ens perfectissimum)’를 상정해낸 것이며, 또한 우주가 위계적 단계로
설정되어있다는 관념을 형성해낸 사실에 있다. 근대 과학의 역사는 그들이 신성한 성서보다 실재에 대해서 훨씬 신뢰할만한 결과를 갖추고 있다고 설득해왔던 과
정의 결과물이다. 과학은 근대적 믿음, 즉 모던 페이스라는 말과 거의 흡사하다. 과학은 그동안 사람들이 중시했던 체계들, 가령, 가치, 의미, 목적, 질, 비가시적인 것
(invisible), 최상의 것(superiors) 등 수직적 차원의 체계들에 대해서는 묵과하면서, 설명할 수 있는 세계만을 실체라고 규정했다. 과학은, 근대적 믿음은, 결국 형이상
학의 세속화에 다름 아니다.
모더니즘 회화는 세계의 이면에 그 어떠한 (신의) 목적도 개입되지 않는다는 허무주의(nihilism)의 드러냄(표현)이다. 추상표현주의는 무의식의 심연에서 이미지를
건져 올린 점에서 허무주의의 연속이었으며, 산업공정의 정치(定置, placement) 개념을 예술에 적용했던 미니멀리즘은 보다 극화된 허무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팝
아트 역시 물질주의가 첨예화된 양식으로서의 허무주의의 또 다른 표현이었다.
1980년대에 진입하면서 스타워즈(Star Wars, 1977), 대부(The Godfather, 1972), 매드맥스(MAD MAX, 1979), 블레이드러너(Blade Runner, 1982)와 같은 영화는 스
펙터클과 서사에서 순수예술을 압도하기에 이르렀고, 1980년대 이후의 회화는 영화가 말할 수 없는, 진리의 세계를 표명해야 했다. 문화와 역사의 시원을 드러내는
가 하면(안젤름 키퍼), 기계를 뛰어넘는 인간의 손의 의미를 현현했고(게르하르트 리히터), 알레고리를 통한 인간 존재의 승격 가능성을 이야기하기도 했다(지그마
폴케).
우리나라의 경우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모더니즘 계열의 회화는 지본의식[知本]을 강화하여 전통적 사유에 수맥을 대고자 했으며, 민중미술은 현실의 괴로운 상
황을 어떻게든 알리고자 했다. 그런데 전자는 내용에서 정당성을 찾기 어려웠고, 후자는 미학적 형식 부재에 시달렸다. 노장사상(老莊思想)에 대한 아그네스 마틴
(Agnes Martin, 1912-2004)의 이해는 우리에 비해 훨씬 풍부했으며, 민중에 대한 시케이로스(David Alfaro Siqueiros, 1896-1974)의 사랑은 우리보다 훨씬 진실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사진을 통한 센티멘털리즘이 우리나라에 유입되고 있었다. 센티멘털리즘은 다양성을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면서 의식을 파편화시킨다는 점
에서 부정적이다.
여기서 우리는 칸트(Immanuel Kant, 1724-1804)의 위대한 명제를 상기해야 한다. “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1) 회화에서도 내용과
개념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내용과 개념에서 완벽한 평형상태를 이루는 회화를 우리는 명화(名畵)라고 부른다. 김남표(金南杓, 1970-)는 내용과 개념을 모두 겸
비한 회화를 복권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모더니즘의 기치(旗幟)인 순수주의나 민중미술이 내세우는 삶을 위한 예술, 혹은 개인의 감상(感傷)을 직접적으로 전달하
는 사진의 양상 그 어느 것도 김남표 작가의 관심 속으로 진입될 수 없었다. 김남표 작가에게는 예술 자체가 중요했다.
1) Frederick Copleston, A History of Philosophy: Wolff to Kant Vol.6(Burns & Oates: Wellwood, 1999), p. 247.: “thoughts without content are empty, intuitions without concepts are
blind.”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