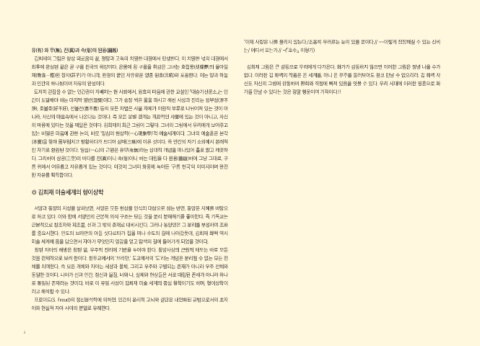Page 6 - 김희재 초대전 2023. 8. 16 – 9. 15 일조원갤러리
P. 6
“이제 사랑은 나를 울리지 않는다./조용히 우러르는 눈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잠잠해질 수 있는 신비
유(有) 와 무(無), 진(眞)과 속(俗)의 원융(圓融) 는/ 어디서 오는가.// ~(「호수」, 이형기)
김희재의 그림은 항상 외로움의 끝, 절망과 고독의 치열한 대결에서 탄생한다. 이 치열한 넋의 대결에서
최후에 완성된 끝은 곧 구름 천국의 하강이다. 온몸에 흰 구름을 휘감은 그녀는 호접몽(胡蝶夢)의 물아일 김희재 그림은 큰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화가가 감동하지 않으면 이러한 그림은 정녕 나올 수가
체(物我一體)된 장자(莊子)가 아니라, 완결의 끝인 자유로운 영혼 원효(元曉)와 포옹한다. 이는 땅과 하늘 없다. 이러한 김 화백의 작품은 온 세계를, 아니 온 우주를 둘러보아도 결코 만날 수 없으리라. 김 화백 자
과 인간의 하나됨이며 자유의 완성이다. 신도 자신의 그림에 감동하며 환희와 격정에 빠져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우리 시대에 이러한 영혼으로 화
도저히 걷잡을 수 없는 인간관이 지배하는 현 사회에서, 원효의 마음에 관한 교설인 「대승기신론소」는 인 가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행운이며 기적이다.!!
간이 도달해야 하는 마지막 열반(涅槃)이다. 그가 송장 썩은 물을 마시고 깨친 사상과 진리는 정부정(淨不
淨), 호불호(好不好), 선불선(善不善) 등의 모든 차별은 사물 자체가 이원적 부류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
니라, 자신의 마음속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즉 모든 분별 경계는 객관적인 사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
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김희재의 최근 그림이 그렇다. 그녀의 그림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비밀은 마음에 관한 논의, 바로 ‘일심의 현상학(一心現象學)’적 예술세계이다. 그녀의 예술혼은 본각
(本覺)을 찾아 몸부림치고 방황하다가 드디어 삼매(三昧)에 이른 것이다. 즉 인간의 자기 소외에서 본래적
인 자기로 환원된 것이다. 일심(一心)의 근원은 유무(有無)라는 상대적 개념을 떠나있어 홀로 맑고 깨끗하
다. 그리하여 삼공(三空)의 바다를 진(眞)이니 속(俗)이니 하는 대립을 다 원융(圓融)하여 그냥 그대로, 구
름 위에서 여유롭고 자유롭게 있는 것이다. 이것이 그녀의 화풍에 녹아든 ‘구름 천국’의 이미지이며 완전
한 자유를 획득함이다.
◎ 김희재 미술세계의 형이상학
서양과 동양의 지성을 살펴보면, 서양은 모든 현상을 인식의 대상으로 삼는 반면, 동양은 지혜를 바탕으
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양인의 근본적 의식 구조는 모든 것을 분리 분해하기를 좋아한다. 즉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창조자와 피조물, 신과 그 밖의 존재로 대비시킨다. 그러나 동양인은 그 분리를 부정하며 조화
를 중요시한다. 인도의 브라만의 아들 싯다르타가 집을 떠나 수도의 길에 나아갔듯이, 김희재 화백 역시
미술 세계에 몸을 담으면서 자아가 무엇인지 영감을 얻고 탐색의 길에 들어가게 되었을 것이다.
참된 자아의 해방은 참된 앎, 우주적 진리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동양사상의 근원적 태도는 바로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보려 함이다. 힌두교에서의 ‘브라만,’ 도교에서의 ‘도’라는 개념은 분리될 수 없는 모든 전
체를 의미한다. 즉 모든 개체와 자아는 세상과 물체, 그리고 우주와 구별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주 전체와
동일한 것이다. 나아가 신과 인간, 정신과 물질, 너와 나, 실체와 현상들은 서로 대립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
로 통일된 존재라는 것이다. 바로 이 유일 사상이 김희재 미술 세계의 중심 철학이기도 하며, 형이상학이
라고 해석할 수 있다.
프로이드(S. Freud)의 정신분석학에 의하면, 인간의 윤리적 고뇌와 결단은 내면화된 규범으로서의 초자
아와 현실적 자아 사이의 분열로 유래한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