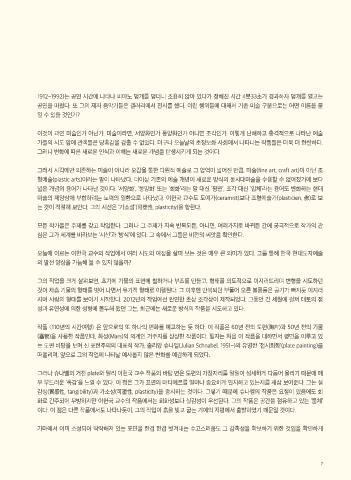Page 9 - 이헌국 조형예술 55년전 한전아트센터 2025. 9. 18 – 9. 26
P. 9
1912~1992)는 공연 시간에 나타나 피아노 덮개를 덮더니 조용히 앉아 있다가 정해진 시간 4분33초가 경과하자 덮개를 열고는
공연을 마쳤다. 또 그의 제자 음악가들은 갤러리에서 전시를 했다.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기존 미술 구분으로는 어떤 이름을 붙
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과연 미술인가 아닌가. 미술이라면, 서양화인가 동양화인가 아니면 조각인가. 이렇게 난해하고 충격적으로 나타난 예술
가들의 시도 앞에 관객들은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더구나 오늘날의 초정보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작품들은 더욱 더 현란하다.
그러니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식과 이해는 새로운 개념을 탄생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시각에만 의존하는 미술이 아니라 오감을 통한 다원적 예술로 그 영역이 넓어진 만큼, 미술(fine art, craft art)이 아닌 조
형예술(plastic arts)이라는 말이 나타났다. 더이상 기존의 예술 개념이 새로운 방식의 동시대미술을 수용할 수 없어졌기에 보다
넓은 개념의 용어가 나타난 것이다. ‘서양화’, ‘동양화’ 또는 ‘회화’라는 말 대신 ‘평면’, 조각 대신 ‘입체’라는 용어도 변화하는 현대
미술의 제양상에 부합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나타났다. 이헌국 교수도 도예가(ceramist)보다 조형예술가(plasticien, 佛)로 보
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그의 시선은 ‘가소성’(可塑性, plasticity)을 향한다.
모든 작가들은 주제를 갖고 작업한다. 그러나 그 주제가 지속 반복되든, 아니면, 여러가지로 바뀌든 간에 궁극적으로 작가의 관
심은 그가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과 ‘방식’에 있다. 그 속에서 그들은 비전의 씨앗을 확인한다.
오늘에 이르는 이헌국 교수의 작업에서 여러 시도의 여정을 살펴 보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그를 통해 한국 현대도자예술
의 발전 양상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의 작업을 크게 살펴보면, 초기에 기물의 표면에 칠하거나 부조를 만들고, 형태를 의도적으로 이지러뜨리며 변형을 시도하던
것이 차츰 기물의 형태를 벗어 나면서 유기적 형태로 이행된다. 그 이후엔 반복되던 부풀어 오른 볼륨들은 공기가 빠지듯 이지러
지며 사람의 형태를 보이기 시작한다. 2012년의 작업에선 완연한 초상 조각상이 제작되었다. 그동안 긴 세월에 걸쳐 태토의 점
성과 유연성에 의한 성형에 몰두해 왔던 그는, 최근에는 새로운 방식의 작품을 시도하고 있다.
작품 〈110년의 시간여행〉 은 앞으로의 또 하나의 변화를 예고하는 듯 하다. 이 작품은 60년 전의 도편(陶片)과 50년 전의 기물
(器物)을 사용한 작품인데, 화성(Mars)의 외계인 거주지를 상상한 작품이다. 필자는 처음 이 작품을 대하면서 평면을 이루고 있
는 도편 바탕을 보며 신 표현주의의 대표적 작가, 줄리앙 슈나벨(Julian Schnabel, 1951~)의 유명한 ‘접시회화’(plate painting)를
떠올리며, 앞으로 그의 작업에 나타날 예사롭지 않은 변화를 예감하게 되었다.
그러나 슈나벨의 거친 plate와 달리 이헌국 교수 작품의 바탕 면은 도편의 가장자리를 일일이 섬세하게 다듬어 올리기 때문에 매
우 부드러운 ‘촉감’을 느낄 수 있다. 이 점은 그가 표면의 마티에르를 얼마나 중요하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새삼 보여준다. 그는 실
감성(實感性, tangibility)과 가소성(可塑性, plasticity)을 중시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슈나벨의 작품은 요철이 있음에도 회
화로 간주되어 무방하지만 이헌국 교수의 작품에서는 회화성보다 실감성이 우선된다. 그의 작품은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물체’
이다. 이 점은 다른 작품에서도 나타나듯이, 그의 작업이 흙을 빚고 굽는 기예의 지평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가마에서 이미 소성되어 딱딱해져 있는 표면을 한겹 한겹 벗겨내는 수고스러움도 그 감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확인하게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