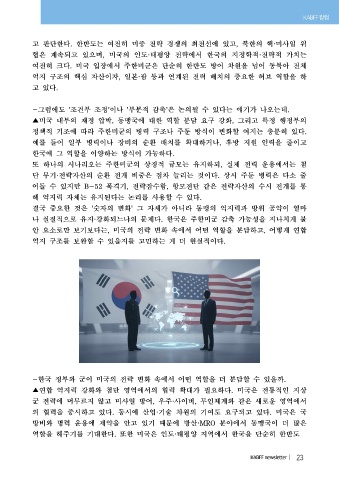Page 23 - 한미기업인친선포럼 25.9,10월 뉴스레터
P. 23
고 판단한다. 한반도는 여전히 미중 전략 경쟁의 최전선에 있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
협은 계속되고 있으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지정학적·전략적 가치는
여전히 크다. 미국 입장에서 주한미군은 단순히 한반도 방어 차원을 넘어 동북아 전체
억지 구조의 핵심 자산이자, 일본·괌 등과 연계된 전력 배치의 중요한 허브 역할을 하
고 있다.
-그럼에도 '조건부 조정'이나 '부분적 감축'은 논의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 내부의 재정 압박, 동맹국에 대한 역할 분담 요구 강화, 그리고 특정 행정부의
정책적 기조에 따라 주한미군의 병력 구조나 주둔 방식이 변화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예를 들어 일부 병력이나 장비의 순환 배치를 확대하거나, 후방 지원 인력을 줄이고
한국에 그 역할을 이양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주한미군의 상징적 규모는 유지하되, 실제 전력 운용에서는 첨
단 무기·전략자산의 순환 전개 비중은 점차 늘리는 것이다. 상시 주둔 병력은 다소 줄
어들 수 있지만 B-52 폭격기, 전략잠수함, 항모전단 같은 전략자산의 수시 전개를 통
해 억지력 자체는 유지된다는 논리를 사용할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숫자의 변화' 그 자체가 아니라 동맹의 억지력과 방위 공약이 얼마
나 실질적으로 유지·강화되느냐의 문제다. 한국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지나치게 불
안 요소로만 보기보다는, 미국의 전략 변화 속에서 어떤 역할을 분담하고, 어떻게 연합
억지 구조를 보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게 더 현실적이다.
-한국 정부와 군이 미국의 전략 변화 속에서 어떤 역할을 더 분담할 수 있을까.
▲연합 억지력 강화와 첨단 영역에서의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 미국은 전통적인 지상
군 전력에 머무르지 않고 미사일 방어, 우주·사이버, 무인체계와 같은 새로운 영역에서
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 동시에 산업·기술 차원의 기여도 요구되고 있다. 미국은 국
방비와 병력 운용에 제약을 안고 있기 때문에 방산·MRO 분야에서 동맹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또한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을 단순히 한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