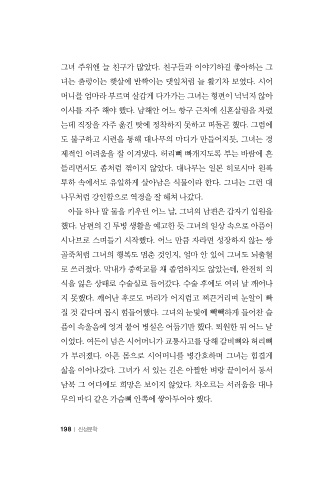Page 182 - 신정문학
P. 182
그녀 주위엔 늘 친구가 많았다. 친구들과 이야기하길 좋아하는 그
녀는 출렁이는 햇살에 반짝이는 댓잎처럼 늘 활기차 보였다. 시어
머니를 엄마라 부르며 살갑게 다가가는 그녀는 형편이 넉넉지 않아
이사를 자주 해야 했다. 남해안 어느 항구 근처에 신혼살림을 차렸
는데 직장을 자주 옮긴 탓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곤 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시련을 통해 대나무의 마디가 만들어지듯, 그녀는 경
제적인 어려움을 잘 이겨냈다. 허리뼈 빠개지도록 부는 바람에 흔
들리면서도 좀처럼 꺾이지 않았다. 대나무는 일본 히로시마 원폭
투하 속에서도 유일하게 살아남은 식물이라 한다. 그녀는 그런 대
나무처럼 강인함으로 역경을 잘 헤쳐 나갔다.
아들 하나 딸 둘을 키우던 어느 날, 그녀의 남편은 갑자기 입원을
했다. 남편의 긴 투병 생활을 예고한 듯 그녀의 일상 속으로 아픔이
시나브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어느 만큼 자라면 성장하지 않는 쌍
골죽처럼 그녀의 행복도 멈춘 것인지, 얼마 안 있어 그녀도 뇌출혈
로 쓰러졌다. 막내가 중학교를 채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완전히 의
식을 잃은 상태로 수술실로 들어갔다. 수술 후에도 여러 날 깨어나
지 못했다. 깨어난 후로도 머리가 어지럽고 찌끈거리며 눈알이 빠
질 것 같다며 몹시 힘들어했다. 그녀의 눈빛에 빽빽하게 들어찬 슬
픔이 속울음에 엉겨 붙어 병실은 어둡기만 했다. 퇴원한 뒤 어느 날
이었다. 여든이 넘은 시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해 갈비뼈와 허리뼈
가 부러졌다. 아픈 몸으로 시어머니를 병간호하며 그녀는 힘겹게
삶을 이어나갔다. 그녀가 서 있는 길은 아찔한 벼랑 끝이어서 동서
남북 그 어디에도 희망은 보이지 않았다. 차오르는 서러움을 대나
무의 마디 같은 가슴뼈 안쪽에 쌓아두어야 했다.
198 | 신정문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