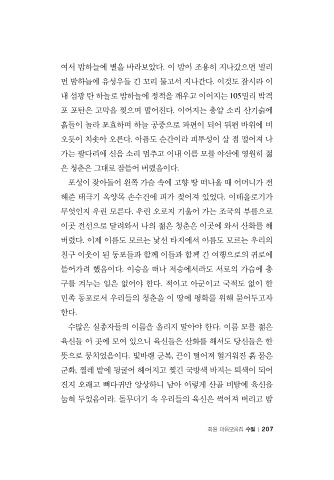Page 191 - 신정문학
P. 191
여서 밤하늘에 별을 바라보았다. 이 밤이 조용히 지나갔으면 멀리
먼 밤하늘에 유성우들 긴 꼬리 물고서 지나간다. 이것도 잠시라 이
내 섬광 탄 하늘로 밤하늘에 정적을 깨우고 이어지는 105밀리 박격
포 포탄은 고막을 찢으며 떨어진다. 이어지는 총알 소리 산기슭에
흙들이 놀라 포효하며 하늘 공중으로 파편이 되어 뒤편 바위에 비
오듯이 치솟아 오른다. 아픔도 순간이라 피투성이 살 점 떨어져 나
가는 팔다리에 신음 소리 멈추고 이내 이름 모를 야산에 영원히 젊
은 청춘은 그대로 잠들어 버렸음이다.
포성이 잦아들어 왼쪽 가슴 속에 고향 땅 떠나올 때 어머니가 전
해준 태극기 옥양목 손수건에 피가 젖어져 있었다. 이데올로기가
무엇인지 우린 모른다. 우린 오로지 기울어 가는 조국의 부름으로
이곳 전선으로 달려와서 나의 젊은 청춘은 이곳에 와서 산화를 해
버렸다. 이제 이름도 모르는 낯선 타지에서 이름도 모르는 우리의
친구 이웃이 된 동포들과 함께 이들과 함께 긴 여행으로의 귀로에
들어가려 했음이다. 이승을 떠나 저승에서라도 서로의 가슴에 총
구를 겨누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적이고 아군이고 국적도 없이 한
민족 동포로서 우리들의 청춘을 이 땅에 평화를 위해 묻어두고자
한다.
수많은 실종자들의 이름을 올리지 말아야 한다. 이름 모를 젊은
육신들 이 곳에 모여 있으니 육신들은 산화를 해서도 당신들은 한
뜻으로 뭉치었음이다. 빛바랜 군복, 끈이 떨어져 헐거워진 흙 묻은
군화, 찔레 밭에 뒹굴어 헤어지고 찢긴 국방색 바지는 퇴색이 되어
진지 오래고 뼈다귀만 앙상하니 남아 이렇게 산골 비탈에 육신을
눕혀 두었음이라. 돌무더기 속 우리들의 육신은 썩어져 버리고 밤
회원 마음모음집 수필 | 207